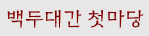벡두대간 사람들 33 청화산- 견훤은 신앙이 되고 산골마을은 박제가 되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강 댓글 0건 조회 201,134회 작성일 18-08-27 12:20본문
견훤은 잊혀진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신화의 강을 건너는 전설의 주인공으로 살아 있다.
문경을 지나면 “백두대간을 다 지났다고 생각해도 좋다”던 문경의 산사람 김규천(42·문경시청 문화담당관실)씨의 말은 틀림이 없었다. 대간의 능선 저편 충북은 단양군과 제천시, 충주시, 괴산군으로 이름을 바꾸는데도 이편은 내내 문경 땅이었다. 소백산 죽령을 건너 남으로 내려오면서 벌재 사기장이들의 꿈을 들었고 송진이 흘러내리는 생나무로 서까래를 이어도 뒤틀리지 않을 정도로 질이 좋다는 황장산 소나무를 만났었다. 백두대간의 눈썹 대미산 여우목 고개와 포암산 하늘재는 신라의 야망과 한을 들려주었다.
일찌감치 자동차 출입을 막아 옛 모습을 지켜낸 문경새재 도립공원은 공원화하면 무조건 삽을 들이대려는 우리나라 공원정책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었다. 백화산 흰두뫼 마을의 마지막 농부 홍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 심은 나무들은 그새 얼마나 더 뿌리를 내렸을까? 산문을 닫아 건 희양산 봉암사 스님네들은 가을 산철을 쪼개 다시 화두를 붙잡았을 것이다. 올해 송이가 풍년일 것이라는 젊은 이장 장남식(32)씨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은티마을 저녁은 송이찌개 익어가는 맛난 냄새가 가을을 부르고 있을 것이다.
문경 백두대간이 이렇듯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것은 승천하는 용의 몸짓을 닮은 탓이다. 눈으로는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은 지척인 산봉우리도 막상 걸어보면 끝없는 시간과 체력을 요구한다. 동과 서를 잇던 산줄기가 급작스레 남과 북으로 방향을 바꿀 정도로 굴곡이 심한 탓에 그 산줄기가 품어내는 계곡 또한 깊었다. 문경 백두대간의 남쪽 끝 청화산(984m)과 조항산(951m)이 어깨를 나란히 한 하늘금에 등을 기댄 궁기리 역시 긴 골짜기에 발을 뻗고 견훤의 전설을 들려주고 있었다.
“옛날에 말여 신라가 고구려를 치고 백제까지 이겼거든. 백제 사람들이 그대로 있다믄 노예가 될 판이라. 그래 죄다 도망가는데 일본으로도 가고 산골로도 가고 그랬다고 하데. 부자들이 이곳 문경으로 왔대지. 그래 그 후손이 견훤이라는 거야. 저 가은 아차마을이 지금은 갈전이라 부르는데, 그게가 고향이야. 궁터는 견훤 대궐이 있어 궁터고.” 궁기리로 들어가는 길목, 견훤이 용마를 얻었다는 말바위가 있는 연천리에서 만난 노인은 백제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내력까지 들려주었다.
역사는 왕건에 무릎꿇은 견훤을 도적 무리의 두목쯤으로 기억하고 있는 데 문경시 가은읍과 농암면, 상주시 화북면 등 궁기리 인근의 마을에서 견훤은 잊혀진 인물이 아니다. 아차, 말바위, 연천, 궁터, 대궐터 등 땅이름에 견훤은 살아 있다. 삼한 통일의 꿈을 달구던 청년 견훤의 웅비가 1천년도 넘는 긴 세월 강을 흘러오면서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고향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에 고개를 끄덕이기에는 견훤의 흔적은 너무나 깊고 넓다. 게다가 전설은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의 자취와 견훤의 자취를 혼동하고 있었다.
궁기리 견훤의 자취와 함께 묻어 나는 경순왕 행궁의 이야기를 들려준 이는 궁기1리 김상욱(47) 이장이었다. 김 이장은 궁기리 초입의 연천리 이름의 유래를 왕의 가마(연)가 내(천)를 건넜기 때문에 생긴 이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연천리를 건너 북으로 올라가면 희양산 봉암사에 닿을 수 있다. 봉암사 극락전에는 경순왕이 머물렀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다. 경순왕이 궁기리에 피난을 왔다가 장수의 전사소식을 듣자 불길하다며 봉암사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이 전해 들을 수 있는 전설의 한 갈래였다.
마을 노인들은 최근 들어 부쩍 견훤을 찾는 발길이 잦아진 이유를 되물었다. 역사는 현재의 필요에 의해서 재창조되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전설에서 사실의 실을 뽑아 잊혀진 역사를 갈무리하는 것은 역사학자들의 몫일 것이다. 견훤이 여전히 도적의 무리로 남을지 무고한 백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왕건에게 자신의 꿈을 내어준 시대의 풍운아였는지도 역사가들이 밝혀낼 것이다.
견훤은 천년세월 이전의 사람이다. 그 긴 세월은 견훤을 역사의 질곡에서 건져내 신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산골마을은 등을 산에 기대고 다리를 계곡으로 뻗게 마련이다. 옛 사람들은 휑하니 뚫린 마을의 앞이 부담스러웠는지 돌무더기로 작은 산을 만들어 허전한 지세를 달랬다. 이러한 골맥이 풍습은 한국전쟁을 치르고 근대화를 거치면서 많은 지역에서 미신이란 탈을 쓴 채 무너져갔다. 그러나 문경지방, 특히 견훤의 전설이 남아 있는 마을 대부분은 골맥이 풍습을 원형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농암면 청암중학교 운동장에 남아 있는 골맥이에, 상주시 하송리 송내마을의 골맥이 정수리 부분에 서 있는 자연석은 견훤의 다른 모습이다. 그곳에서 견훤은 마을의 허전한 지세를 누르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준다. 매년 정월이면 ‘동고사를 잡숫는 신’의 반열에 올라서서 산골마을 사람들의 “상부상조하는 사촌지정(四寸之情)”을 나누게 한다. 하송리 청계마을 산제당에서 만나는 ‘후백제대왕신위’라 적힌 위패는 신으로서 견훤의 위상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은 잊혀진 과거일 뿐이다. 골맥이 돌산 위에 금줄을 두르고 곧추산 자연석이 견훤의 다른 모습임을 아는 이들도 자꾸만 줄어만 간다. 전국에서도 으뜸이었다는 풍물은 소리를 잃은 지 오래다. 멀리 상주까지 견훤의 전설을 간직한 마을 사람들의 유대감을 다져주던 정월 기세배 풍습도 이제는 기록으로만 전달되는 사라진 무형의 문화재가 돼버렸다.
견훤이 쌓은 성이 있는 성재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성저리라는 이름을 갖게 된 마을에 모산굴이라는 굴이 있다. 임진왜란 당시 굴로 피난왔던 마을 사람들은 왜군에 발각돼 고추연기에 질식해 원혼이 됐다고 한다. 이 원혼을 위로하는 한판 풍물굿이 성저리 기세배였다고 한다. 멀리 상주에 이르기까지 마을의 풍물패들은 귀신달군날인 정월 열엿새면 마을 기를 앞세우고 모산굴 앞에 모였다.
장단에 맞춰 기를 숙여 귀신들에게 세배를 올리면서 각 마을의 풍물패들은 서로의 장단과 가락을 겨루었다고 한다. 5년이나 10년 주기로 행해지던 기 세배는 일제 식민지 통치 시절에 오히려 연례행사로 강화된다.
눈을 감고 상상해보라. 각 마을을 출발한 풍물패들이 겨울 찬바람에 굴하지 않고 기를 앞세워 들판을 지나 다른 마을의 풍물패들과 만나며 세를 불려가는 모습을. 굴 앞에 이를 때쯤이면 그 수가 수 백명으로 불어나 풍물소리는 산을 뒤흔들었다고 하다. 원혼을 위로하고도 남아 일제의 총칼을 주눅들게 하던 어른들의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코끝이 찡해지지 않는가. 그 기개는 한낱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삼한통일의 원을 세워두고 60대 고령의 나이까지 풍찬노숙을 마다지 않았던 견훤의 기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당시 풍물은 정월의 기세배뿐 아니라 일상이었다고 한다. 정월 지신밟기부터 모내기, 김매기 등 들일에서도 풍물은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것이었다. 들일을 나갈 때면 풍물패가 앞장서 길굿을 올려 논과 밭을 내어준 지신에게 감사드리고 마을의 노동력을 나누는 수단이었다. 7월을 넘겨 들일이 대충 마무리될 무렵에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풀굿이 빠지지 않았다고 한다. 마을에서 여유있는 이들이 술과 음식을 내고 한판 잔치로 지나온 노동과정 속에서 혹 있을지도 모를 맺힘을 풀어 공동체로서 마을의 결속력을 다지는 귀한 자리였다고 한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 풍속은 한국전쟁 와중에 맥이 끊겼고 곧이어 불어닥친 근대화 바람에 흩어져버렸다고 한다. 카세트가 토해 놓는 유행가 가락이 풍물의 자리를 차지하고 별빛 바라보며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전설을 전하던 동구나무 아래에서 맞는 여름밤은 텔레비전 연속극이 앗아가 버렸다. 견훤의 전설을 나누던 산골 마을들은 이제 47살이 심부름하는 나이일 정도로 늙어버렸다. 풍물을 되살리자고 하지만 이제 그 누가 북을 메고 장구를 칠 것인가. 궁기리 중궁의 폐교된 학교 운동장은 이제 아예 밭이 돼버렸다. 그 밭에 아이들이 뛰어 놀아야 견훤의 전설은 다음 천년에도 이어질 것 아닌가. 닫힌 학교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은 그 작은 출발일 수 있다.
출처: http://100mt.tistory.com/entry/벡두대간-사람들-33-청화산-견훤은-신앙이-되고-산골마을은-박제가-되고 [<한겨레21> 신 백두대간 기행 블로그]
문경을 지나면 “백두대간을 다 지났다고 생각해도 좋다”던 문경의 산사람 김규천(42·문경시청 문화담당관실)씨의 말은 틀림이 없었다. 대간의 능선 저편 충북은 단양군과 제천시, 충주시, 괴산군으로 이름을 바꾸는데도 이편은 내내 문경 땅이었다. 소백산 죽령을 건너 남으로 내려오면서 벌재 사기장이들의 꿈을 들었고 송진이 흘러내리는 생나무로 서까래를 이어도 뒤틀리지 않을 정도로 질이 좋다는 황장산 소나무를 만났었다. 백두대간의 눈썹 대미산 여우목 고개와 포암산 하늘재는 신라의 야망과 한을 들려주었다.
일찌감치 자동차 출입을 막아 옛 모습을 지켜낸 문경새재 도립공원은 공원화하면 무조건 삽을 들이대려는 우리나라 공원정책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었다. 백화산 흰두뫼 마을의 마지막 농부 홍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 심은 나무들은 그새 얼마나 더 뿌리를 내렸을까? 산문을 닫아 건 희양산 봉암사 스님네들은 가을 산철을 쪼개 다시 화두를 붙잡았을 것이다. 올해 송이가 풍년일 것이라는 젊은 이장 장남식(32)씨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은티마을 저녁은 송이찌개 익어가는 맛난 냄새가 가을을 부르고 있을 것이다.
문경 백두대간이 이렇듯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것은 승천하는 용의 몸짓을 닮은 탓이다. 눈으로는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은 지척인 산봉우리도 막상 걸어보면 끝없는 시간과 체력을 요구한다. 동과 서를 잇던 산줄기가 급작스레 남과 북으로 방향을 바꿀 정도로 굴곡이 심한 탓에 그 산줄기가 품어내는 계곡 또한 깊었다. 문경 백두대간의 남쪽 끝 청화산(984m)과 조항산(951m)이 어깨를 나란히 한 하늘금에 등을 기댄 궁기리 역시 긴 골짜기에 발을 뻗고 견훤의 전설을 들려주고 있었다.
“옛날에 말여 신라가 고구려를 치고 백제까지 이겼거든. 백제 사람들이 그대로 있다믄 노예가 될 판이라. 그래 죄다 도망가는데 일본으로도 가고 산골로도 가고 그랬다고 하데. 부자들이 이곳 문경으로 왔대지. 그래 그 후손이 견훤이라는 거야. 저 가은 아차마을이 지금은 갈전이라 부르는데, 그게가 고향이야. 궁터는 견훤 대궐이 있어 궁터고.” 궁기리로 들어가는 길목, 견훤이 용마를 얻었다는 말바위가 있는 연천리에서 만난 노인은 백제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내력까지 들려주었다.
역사는 왕건에 무릎꿇은 견훤을 도적 무리의 두목쯤으로 기억하고 있는 데 문경시 가은읍과 농암면, 상주시 화북면 등 궁기리 인근의 마을에서 견훤은 잊혀진 인물이 아니다. 아차, 말바위, 연천, 궁터, 대궐터 등 땅이름에 견훤은 살아 있다. 삼한 통일의 꿈을 달구던 청년 견훤의 웅비가 1천년도 넘는 긴 세월 강을 흘러오면서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고향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에 고개를 끄덕이기에는 견훤의 흔적은 너무나 깊고 넓다. 게다가 전설은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의 자취와 견훤의 자취를 혼동하고 있었다.
궁기리 견훤의 자취와 함께 묻어 나는 경순왕 행궁의 이야기를 들려준 이는 궁기1리 김상욱(47) 이장이었다. 김 이장은 궁기리 초입의 연천리 이름의 유래를 왕의 가마(연)가 내(천)를 건넜기 때문에 생긴 이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연천리를 건너 북으로 올라가면 희양산 봉암사에 닿을 수 있다. 봉암사 극락전에는 경순왕이 머물렀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다. 경순왕이 궁기리에 피난을 왔다가 장수의 전사소식을 듣자 불길하다며 봉암사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이 전해 들을 수 있는 전설의 한 갈래였다.
마을 노인들은 최근 들어 부쩍 견훤을 찾는 발길이 잦아진 이유를 되물었다. 역사는 현재의 필요에 의해서 재창조되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전설에서 사실의 실을 뽑아 잊혀진 역사를 갈무리하는 것은 역사학자들의 몫일 것이다. 견훤이 여전히 도적의 무리로 남을지 무고한 백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왕건에게 자신의 꿈을 내어준 시대의 풍운아였는지도 역사가들이 밝혀낼 것이다.
견훤은 천년세월 이전의 사람이다. 그 긴 세월은 견훤을 역사의 질곡에서 건져내 신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산골마을은 등을 산에 기대고 다리를 계곡으로 뻗게 마련이다. 옛 사람들은 휑하니 뚫린 마을의 앞이 부담스러웠는지 돌무더기로 작은 산을 만들어 허전한 지세를 달랬다. 이러한 골맥이 풍습은 한국전쟁을 치르고 근대화를 거치면서 많은 지역에서 미신이란 탈을 쓴 채 무너져갔다. 그러나 문경지방, 특히 견훤의 전설이 남아 있는 마을 대부분은 골맥이 풍습을 원형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농암면 청암중학교 운동장에 남아 있는 골맥이에, 상주시 하송리 송내마을의 골맥이 정수리 부분에 서 있는 자연석은 견훤의 다른 모습이다. 그곳에서 견훤은 마을의 허전한 지세를 누르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준다. 매년 정월이면 ‘동고사를 잡숫는 신’의 반열에 올라서서 산골마을 사람들의 “상부상조하는 사촌지정(四寸之情)”을 나누게 한다. 하송리 청계마을 산제당에서 만나는 ‘후백제대왕신위’라 적힌 위패는 신으로서 견훤의 위상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은 잊혀진 과거일 뿐이다. 골맥이 돌산 위에 금줄을 두르고 곧추산 자연석이 견훤의 다른 모습임을 아는 이들도 자꾸만 줄어만 간다. 전국에서도 으뜸이었다는 풍물은 소리를 잃은 지 오래다. 멀리 상주까지 견훤의 전설을 간직한 마을 사람들의 유대감을 다져주던 정월 기세배 풍습도 이제는 기록으로만 전달되는 사라진 무형의 문화재가 돼버렸다.
견훤이 쌓은 성이 있는 성재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성저리라는 이름을 갖게 된 마을에 모산굴이라는 굴이 있다. 임진왜란 당시 굴로 피난왔던 마을 사람들은 왜군에 발각돼 고추연기에 질식해 원혼이 됐다고 한다. 이 원혼을 위로하는 한판 풍물굿이 성저리 기세배였다고 한다. 멀리 상주에 이르기까지 마을의 풍물패들은 귀신달군날인 정월 열엿새면 마을 기를 앞세우고 모산굴 앞에 모였다.
장단에 맞춰 기를 숙여 귀신들에게 세배를 올리면서 각 마을의 풍물패들은 서로의 장단과 가락을 겨루었다고 한다. 5년이나 10년 주기로 행해지던 기 세배는 일제 식민지 통치 시절에 오히려 연례행사로 강화된다.
눈을 감고 상상해보라. 각 마을을 출발한 풍물패들이 겨울 찬바람에 굴하지 않고 기를 앞세워 들판을 지나 다른 마을의 풍물패들과 만나며 세를 불려가는 모습을. 굴 앞에 이를 때쯤이면 그 수가 수 백명으로 불어나 풍물소리는 산을 뒤흔들었다고 하다. 원혼을 위로하고도 남아 일제의 총칼을 주눅들게 하던 어른들의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코끝이 찡해지지 않는가. 그 기개는 한낱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삼한통일의 원을 세워두고 60대 고령의 나이까지 풍찬노숙을 마다지 않았던 견훤의 기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당시 풍물은 정월의 기세배뿐 아니라 일상이었다고 한다. 정월 지신밟기부터 모내기, 김매기 등 들일에서도 풍물은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것이었다. 들일을 나갈 때면 풍물패가 앞장서 길굿을 올려 논과 밭을 내어준 지신에게 감사드리고 마을의 노동력을 나누는 수단이었다. 7월을 넘겨 들일이 대충 마무리될 무렵에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풀굿이 빠지지 않았다고 한다. 마을에서 여유있는 이들이 술과 음식을 내고 한판 잔치로 지나온 노동과정 속에서 혹 있을지도 모를 맺힘을 풀어 공동체로서 마을의 결속력을 다지는 귀한 자리였다고 한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 풍속은 한국전쟁 와중에 맥이 끊겼고 곧이어 불어닥친 근대화 바람에 흩어져버렸다고 한다. 카세트가 토해 놓는 유행가 가락이 풍물의 자리를 차지하고 별빛 바라보며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전설을 전하던 동구나무 아래에서 맞는 여름밤은 텔레비전 연속극이 앗아가 버렸다. 견훤의 전설을 나누던 산골 마을들은 이제 47살이 심부름하는 나이일 정도로 늙어버렸다. 풍물을 되살리자고 하지만 이제 그 누가 북을 메고 장구를 칠 것인가. 궁기리 중궁의 폐교된 학교 운동장은 이제 아예 밭이 돼버렸다. 그 밭에 아이들이 뛰어 놀아야 견훤의 전설은 다음 천년에도 이어질 것 아닌가. 닫힌 학교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은 그 작은 출발일 수 있다.
출처: http://100mt.tistory.com/entry/벡두대간-사람들-33-청화산-견훤은-신앙이-되고-산골마을은-박제가-되고 [<한겨레21> 신 백두대간 기행 블로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